아무리 가도 가도 다른 것이 없다.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사람들은 똑같은 곳에 앉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주제를 논할 뿐이다. 전동차 안에 앉아 죽은 듯 눈을 감고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끝나는 시간, 나는 번화한 거리가 아닌 어두운 뒷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크고 깨끗한 빌딩은 아니다. 불빛이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넘쳐나지도 않는다. 콘크리트 포장이 벗겨져 울퉁불퉁한 거리의 건물은 낡고 불빛은 어둡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숲속의 작은 짐승들처럼 낯을 가리고 목소리를 낮춘다. 그이들이 찾아드는 집들은 찾기 어렵고 찾았다 해도 겉모습을 보고 가늠하기 어렵다. 과연 제대로 온 것일까? 영업은 하는 것일까? 용기를 내어 문을 열면 시간이 멈춘 듯 아마 저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한 탁자, 끝이 닳아버린 숟가락, 허리가 굽은 주인장, 낮은 조도의 형광등 불빛에 의지해 보내는 시간은 오래된 농담 같다. 그리고 이 농담은 한국의 부(富)가 모여든다는 강남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거센 세월의 흐름이 돌아가는 곳, 강북의 을지로와 종로에 은일(隱逸)을 꿈꾸며 오래도록 자리한 노포(老鋪)에서 잊힌 노래를 듣는다.
세월의 맛을 느끼려 노포를 찾는다면 우선 가야 할 곳은 을지로 3가 일대다. 아직도 문을 닫지 않은 철공소 단층 건물이 군락을 이룬 이곳에 가면 골목 어귀어귀 작게 둥지를 잡은 식당이 여럿이다. 늦은 저녁거리를 걸으면 까맣게 절은 러닝셔츠마저 벗고 등목을 하는 사내들이 있다.

그 골목에서 가장 자리 잡기 힘든 곳은 ‘세진식당’이다. 1991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탁자 하나에 석유 곤로를 놔두고 라면 장사로 시작했다는 이곳은 이제 어엿한 식당이요, 주인의 아들은 중년이 되어 머리가 희끗하다. 메뉴를 보면 흔한 밥집 메뉴인 김치찌개, 된장찌개부터 시작하는데 삼합, 생태탕에 이르러서는 고개가 갸웃한다. 그러다 시가(市價)인 갑오징어 숙회를 보면 이곳의 정체성에 대해 잠시 고민하게 된다. 보통 오래 살아남은 집들이 그러하듯 주문이 들어가면 음식은 빠르게 나온다. 업력이 길어 손님이 어떤 주문을 할지, 어떻게 하면 음식이 빨리 나갈지 이미 계산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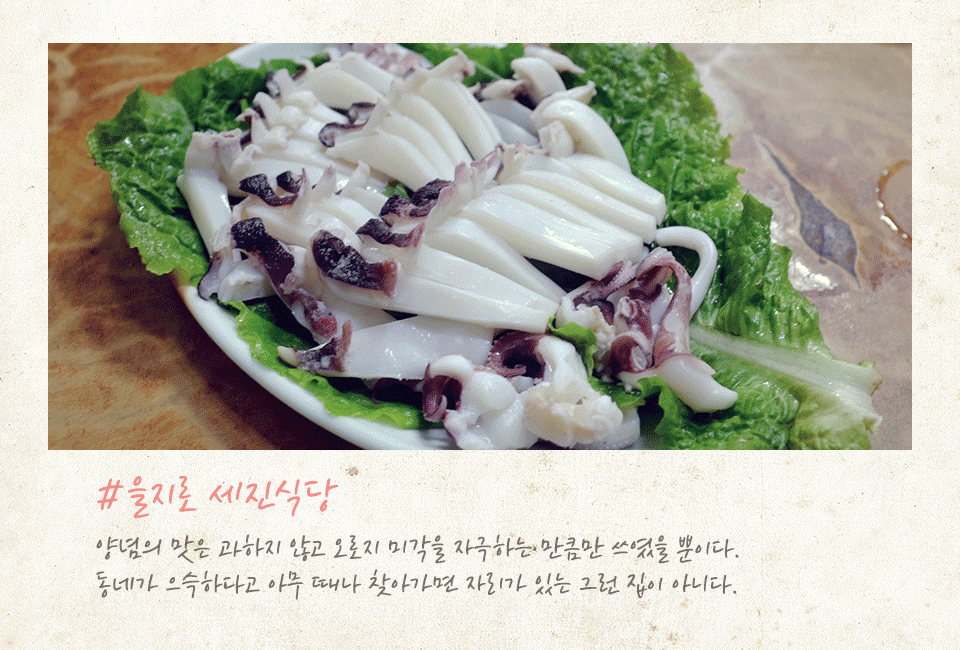
유지태를 닮은 중년의 아들이 음식을 가져다주면 맛을 볼 차례가 남는다. 흘깃 주방을 살펴봤을 때는 채 1만 원이 되지 않는 싸구려 프라이팬과 찜기와 솥뿐이었는데 나오는 음식의 수준을 보면 과연 고수는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양념의 맛은 과하지 않고 오로지 미각을 자극하는 만큼만 쓰였을 뿐이다. 흔한 오징어 볶음도 이곳의 맛은 다르다. 채소를 약한 불에 볶아 물이 흥건한 하급이 아니다. 물이 자작하니 북인도의 드라이 카레를 먹는 것 같은 농축된 맛과 오래 볶지 않아 질기지 않고 쫄깃한 식감만 남았다. 강남의 반값도 되지 않는 갑오징어 숙회는 이 집의 필청 메뉴요, 민물새우를 넣어 감칠맛을 극대화한 전라도식 생태탕과 풀어져 내려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이 살아 있는 야들야들하고 탱탱한 돼지 수육이 곁들여 나오는 삼합은 이 집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동네가 으슥하다고 아무 때나 찾아가면 자리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이가 여럿, 사려 깊게 예약 전화를 넣는 것이 현명한 이의 자세다.
이곳을 빠져나와 골목을 건너면 을지로 골뱅이 거리가 나온다. 이곳에 모인 골뱅이 집은 여럿이지만 단 하나의 집을 골라야 한다면 ‘영락골뱅이’를 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곳이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크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단골집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딱 영락골뱅이 맛이야.”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살던 시절,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은 골뱅이무침을 해 먹었다. 부산에서는 흔히 초고추장에 골뱅이를 버무려 냈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았다. 간장과 고춧가루, 마늘로 양념을 해 그 맛이 번잡스럽지 않고 깔끔했다. 북어포를 채 썰어서 파채와 함께 버무리는 것도 특징이었다. 어렸을 적에는 그저 어머니의 솜씨인 줄 알았다. 커서 서울에 와 말로만 듣던 영락골뱅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신화 속 인물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신기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이 집의 골뱅이 맛이 우리 집의 그것과 똑같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서울 생활을 추억하며 골뱅이무침을 만들었고 나는 어른이 되어 그 골뱅이무침의 시작을 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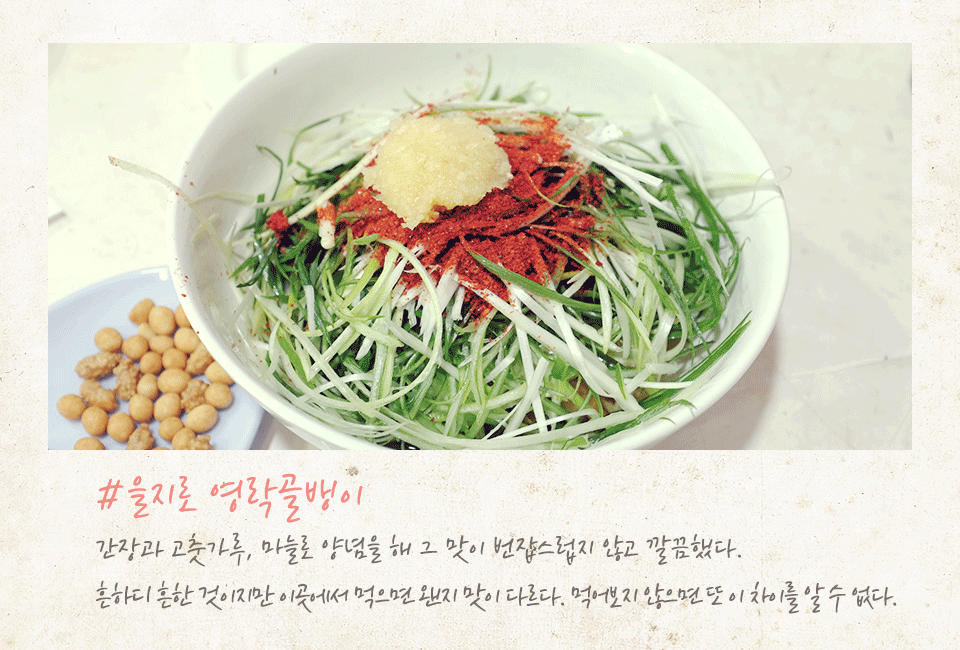
영락골뱅이의 특징은 언제나 계란말이가 서비스로 나온다는 점이다. 계란 파동이라 하여 사람들이 계란 먹기를 꺼려했을 때도 이 집은 되려 더욱 크게 계란을 말아 손님상에 올렸다. 호기가 엿보이는 이런 태도는 역시 시간에서 나온다. 나라가 망할 것처럼 휘청거려도 이 집은 문을 열었고 사람은 끊이지 않았다. 골뱅이 캔을 따서 파채와 양념, 그리고 빻은 마늘 한 숟가락 올려주는 게 무슨 대수냐고 할지도 모른다. 빛바랜 벽지와 달력, 나무 기둥과 좁은 계단, 늘 보는 찬모의 얼굴마저도 맛이 되고 멋이 된다. 이곳의 메뉴는 골뱅이무침 하나로 귀결되지만, 꼭 스팸 구이는 먹어보길 권한다. 흔하디흔한 것이지만 이곳에서 먹으면 왠지 맛이 다르다. 먹어보지 않으면 또 이 차이를 알 수도 없다.

만약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을지로 3가 지하철역 10번 출구에 있는 ‘안동장’을 꼽아야 한다. 1948년 문을 열어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중국집이란 별칭을 얻은 이곳은 단지 오래되었다고 다니는 집은 아니다. 한 번 식당을 개조해 식사하기 쾌적하여 남들에게 추천하기 좋다는 점은 이곳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안동장에서 맛을 봐야 할 것을 여러 가지지만 초행자라면 우선 굴짬뽕과 탕수육을 맛봐야 한다. 안동장의 굴짬뽕은 특히 유명한데 소문에 의하면 굴짬뽕을 처음 개발한 곳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한다. 속에 쌓인 세속의 먼지를 다 씻어내리는 듯한 개운한 국물과 깔끔한 뒷맛은 명불허전, 겨울 찬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안동장의 굴짬뽕이 생각날 정도다.

중국집의 기본 메뉴인 탕수육도 이곳은 맛이 다르다. 찍먹이니 부먹이니 할 것은 없다. 당연히 중화 냄비, 웍(Wok)에서 소스를 한번 굴려 입혀 나와야 하는 것이 정석, 안동장의 탕수육은 유행하듯이 아주 바삭거리지도 그렇다고 살이 콱 씹히는 두꺼운 종류도 아니다. 조금 폭신하다는 느낌이 있는, 오래전부터 먹은 그 맛, 그러나 얼갈이배추를 썰어 넣어 소스의 감칠맛이 남다르다. 그 미묘한 차이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살아남기 위한 연구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기에 나는 탕수육 한 점을 먹을 때도 겸허해진다. 그리고 하얀 머리를 한 노인이 허리를 숙여 주문을 받고 음료수 한 병을 가져다줄 때도 친절히 마개를 따 주는 그 세심함에 노포의 명성이란 쉬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내가 거리를 쏘다니며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깨달음보다 더욱 나를 이 낡은 거리로 이끄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세월 속에, 그 무상함 속에 살아남는 것들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나이가 들고, 점점 사라져가는 그 무상한 것들, 몇 푼 되지 않는 한 끼 속에 잠든 시간과 그 한 끼를 만들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 전해지지 못하고 다 기억되지도 못하며 그저 거리에 잠들고 잊힐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