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로는 곧 사라진다. 이름은 남지만 최소한 알고 지내던 을지로 거리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사라진 곳도 있다. 새롭게 높은 빌딩도 많이 들어섰다. 오래된 거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건물이 노후되면, 도시에 새로운 쓰임이 생겨나면 세월에 산이 깎이듯 새로운 건물, 새로운 거리가 생긴다. 그럼에도 잊혀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은 모두 그리워지고 그리움은 슬픔을 남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을지로로 가는 이유는 곧 떠나보내야 하는 오랜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____
이름처럼 옛스런
사랑방 칼국수
을지로1가에서 5가 너머까지 가야 할 곳은 많다. 하지만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듯한 의무감을 떨친다면 또 마음에 담아둔 곳은 몇 되지 않는다. 그중 을지로3가 ‘사랑방칼국수’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집에 가는 듯한 곳이다. 인쇄소가 펼쳐진 좁은 골목 사이, 인부들이 인쇄물이 잔뜩 올라간 카트를 밀고 퀵 오토바이가 곡예 운전을 하며 빠져나가는 곳에 ‘사랑방칼국수’가 있다.

을지로3가에서 충무로 쪽으로 걸어 올라오다 보면 1968년에 문을 열었다는 문구가 맨 앞, 그 옆에 쓰인 ‘어머니의 손맛을 전수재현’했다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보이면 제대로 찾은 것이다. 옛날 길바닥에 나붙던 대자보처럼 글자가 잔뜩 써 있는 간판은 정신 사납기보단 옛 자취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간다.

문을 열면 나무로 짠 의자와 테이블이 빼곡하다. 여기저기 초록빛 식물이 자란 화분도 놓였다. 삐걱거리는 의자에 엉덩이를 올리면 ‘보신과 보양에 으뜸 통닭 백숙’, ‘내용있는 음식, 실속있는 식사 백숙 백반’ 같은 옛투에 옛글자체로 쓴 메뉴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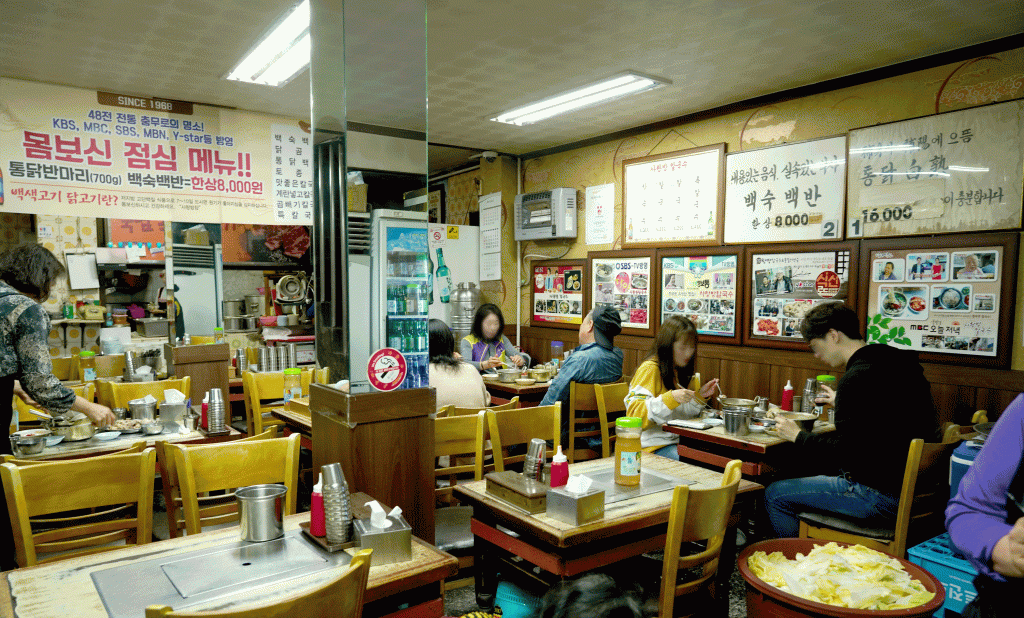
가게 이름에 ‘칼국수’가 붙은 만큼 멸치육수 향이 진득한 칼국수 한 그릇에 점심을 때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달걀 투하 여부에 따라 값은 2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김가루와 송송 썬 파, 통깨를 국물에 훌훌 풀고 미끈한 면발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폼새만 봐도 단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않고 빠르게 면을 먹고 냄비째 들고 국물을 마시는 이는 100퍼센트 단골이다. 무채색의 점퍼를 입었다면 확률은 120퍼센트로 치솟는다. 몸에 낀 먼지를 저 밑으로 쓸어내릴 듯 시원한 국물과 배가 부른 칼국수 면을 마시듯 먹는 이들은 점심 나절에 붐빈다.


닭 반 마리를 국물, 공깃밥과 내놓는 백숙 백반도 점심 메뉴로 빼놓을 수 없다. 절반으로 잘라 스테인레스 접시 위에 척하고 올려 내놓는 백숙 백반은 ‘단백질 한 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영양이 충분하다.

이 골목에서 온종일 무거운 것을 어깨 위에 지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십 년간 먹어왔을 음식이다. 피보다 진한 땀을 흘리고 허기가 졌을 때 기름이 동동 뜬 닭 국물에 흰밥을 말고 뼈에서 살결대로 떨어지는 닭고기를 먹으며 다시 이어질 한나절을 준비했을 것이다.

야들야들 부드러운 닭고기는 평범하게 소금 후추에 찍어도 좋지만 따로 준비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도 별미다. 시큼한 산미가 닭고기의 기름진 맛과 어우러져 풍미를 끌어올린다. 칠이 군데 군데 벗겨진 탁자 위에 한 상 차려 먹어도 값은 크게 나가지 않는다. 대신 빨간 김치, 양파 같은 것을 우적우적 씹고 닭다리를 뜯어야 한다. 그래서 배가 부르지 않으면 이 집에 온 기분이 나지 않는다. 또 그래야만 할 것 같다. ‘산업역군’이란 말을 들으며 먼지를 밥처럼 마시고 땀을 물처럼 흘렸던 이들을 추억하노라면 더욱 그렇다.
____
술 잔 기울이기 좋은
황평집
‘사랑방칼국수’를 나와 을지로4가 쪽으로 걸어가면 역시 닭으로 유명한 ‘황평집’이 있다. ‘사랑방칼국수’에 비해서 유명세는 더 하다. 유명세 때문에 일찍 가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짧지 않은 줄이 선다. 점심에는 역시 닭곰탕 한 그릇에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닭을 수십 마리 한꺼번에 삶아 낸 국물은 논리적으로 한 마리 넣은 육수와 다를 게 없지만, 또 ‘역시 많이 해야 맛이나’라는 말을 주억거리게 하는 맛이 있다.

마늘을 듬뿍 넣어 마늘 향이 깊게 벤 육수는 감칠맛이 짝짝 달라붙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도 입맛을 다시게 된다. 밥 한 그릇 뚝딱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일터로 나가는 이들은 뒷모습을 바라보면 괜히 애잔해진다. 저 이들도 어느 집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그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다시 이 집으로 몰려든다. 고개를 탁자에 처박고 숟가락질만 하던 점심 풍경은 없다. 대신 어깨를 쫙 펴고 의자에 기대어 앉아 느긋이 술잔을 주고받는다. 냄비에 부르스타를 받쳐 놓고 끓여가며 먹는 닭 전골과 닭 내장탕은 여럿이 어울리기 좋은 메뉴다. 닭 내장탕은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매진이 되니 부지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집의 대표 메뉴라면 역시 닭찜과 닭 무침이다. 삶았다가 한 소금 식힌 뒤 손으로 쭉쭉 찢어 가지런히 쌓아 손님에게 내는 닭찜은 별 것 아닌 메뉴인데도 계속 손이 간다.
이유는 먹기 좋게 찢어놓은 정성이 첫째요, 살짝 식혀 쫄깃한 식감을 살린 노하우 덕이 둘째다. 무엇보다 이에 찰싹 감겨 씹히는 닭 껍질을 먹어야 한다. 기름기가 뽀얗게 올라오는 껍질 한 조각이면 앞에 앉은 이와 떠드는 웃음이 한 소쿠리 늘어난다.


사과를 썰어 넣은 닭 무침은 새콤달콤하다는 수식어가 브랜드 라벨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음식이다. 살짝 강하다 싶은 양념도 이 거리 풍경과 가게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열기와 밀도를 보면 또 감내할 만 하다. 여기에 인당 한 그릇씩 퍼주는 닭 육수를 마셔가며 먹으면 그 양념도 역시 계산된 수였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____
마성의 보양식 초계탕
평래옥

다시 을지로3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역시 닭 무침이 메뉴에 올라간 ‘평래옥’이 있다. 오이를 어슷어슷 썰어 고추가루 양념에 닭고기를 버무린 닭 무침은 반찬으로도 나온다. 하지만 리필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맛이 그리워 단품을 시키게 되는 게 순서다.

이 집은 닭으로 하는 초계탕이 또 유명한 집이다. 얼갈이배추를 어슷어슷 썰고 메밀면에 새콤한 동치미 국물을 말아 먹는 초계탕은 아무래도 여름에 먹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즈음 미리 초계탕을 먹으며 여름을 예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아삭한 배가 큼직하게 썰려 들어가 있고 겨자를 살짝 풀어 코를 뻥 뚫리게 하는 매운맛이 감도는 국물을 들이켜면 빨리 여름이 오기를 바라게 된다. 노릇하게 부친 빈대떡도 웬만한 전문점보다 나은 솜씨다.

담백한 맛이 입안에 감돌고 익숙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좋은 시간은 늘 그렇듯 빠르게 흐른다. 넓게 폈던 한 상도 또 치우고 거둬야 하는 때가 찾아온다. 이 거리도 그럴 것이다. 이 거리를 걷던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신세계프라퍼티 리징 2팀 정동현 셰프
신세계프라퍼티 리징 2팀에서 ‘먹고(FOOD) 마시는(BEVERAGE)’일에 몰두하고 있는 셰프,
오늘도 지구촌의 핫한 먹거리를 맛보면서 혀를 단련 중!
저서로는 <셰프의 빨간 노트>, <그릇을 비우고 나면 많은 것이 그리워졌다>가 있다.





